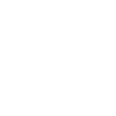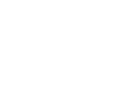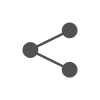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산문집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에 마음이 가는 경우입니다.
수필이니 가볍게 집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 속 삶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무겁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도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예전 밑줄 친 문장 일부는 와 닿지 않았습니다. 새로 밑줄을 긋습니다. 시간이 흘러 글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내가 맞닥뜨린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곁에 두고 읽는 책입니다. 혹시 그런 책은 없으신지요?
『내 생애 단 한 번』
장영희 ∣ 샘터사 ∣ 296쪽 ∣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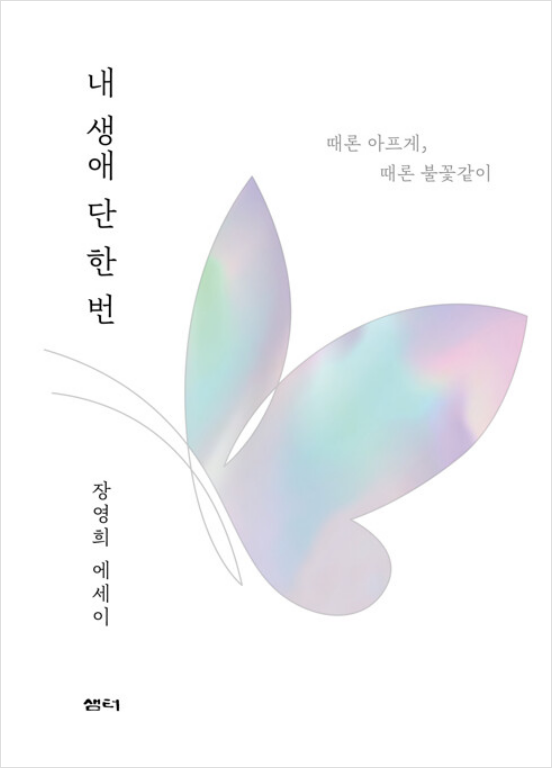

저자는 첫 우리말 수필집인 이 책으로 ‘올해의 문장상’을 받고, 암 투병을 하면서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을 계속 써 왔습니다. 그러다 200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그분의 글을 읽어봅니다. 저자는 자신을 세 가지에 둔한 ‘삼치’를 넘어 ‘둔치’라고 말합니다. 할 줄 모르는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단 나뿐만 아니라 삶에 관한 한 어쩌면 우리 모두가 ‘둔치’인지도 모른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남에게 상처주고 상처입고, 잘못 판단하여 너무 늦게 깨닫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살아가면서 겨우겨우 조금씩 터득해 가는 둔치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신은 모르시는 것이 아닌지. 인간들은 무엇이든 경험으로 제일 잘 터득하고, ‘어떻게 사는가’를 배우는 방법은 실제로 시행착오를 하면서 살아 봄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어 말합니다. “어차피 삶은 한 번뿐이고, 연습은 없는 것을. 오늘도 나는 ‘삼치’에 ‘둔치’로 이리 헤매고 저리 넘어지지만, 내 생애 단 한 번 오는 2000년이라는 숫자는 너무 가슴 벅차고, 넘어지면서 보아도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해는 여전히 아름답다.” 그래서 “무덤덤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보다는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찬란한 섬광 속에서 사랑의 불꽃을 한껏 태우는 삶이 더 나으리라”고 말합니다.
밑줄 그은 문장을 옮깁니다. ”‘진짜’는 사랑받는 만큼 의연해질 줄 알고, 사랑받는 만큼 성숙할 줄 알며, 사랑받는 만큼 사랑할 줄 안다. ‘진짜’는 아파도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를 의심하지 않으며, 살아가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다.” “사람 사는 게 엎어치나 뒤치나 마찬가지고, ‘나’ ‘너’ ‘남’ ‘놈’도 따지고 보면 다 그저 받침 하나, 점 하나 차이일 뿐이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악착같이 ‘나’와 ‘남’ 사이에 깊은 골을 파 놓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보통 ‘삶은 양보다 질이다. 지지부진하게 길고 가늘게 사느니 차라리 굵고 짧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들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는데, 화끈하고 굵게, 그렇지만 짧게 살다 가느니 보통밖에 안 되게, 보일 듯 말 듯 가늘게 살아도 오래 살고 싶다.”
『잡초는 없다』
윤구병 ∣ 보리 ∣ 262쪽 ∣ 199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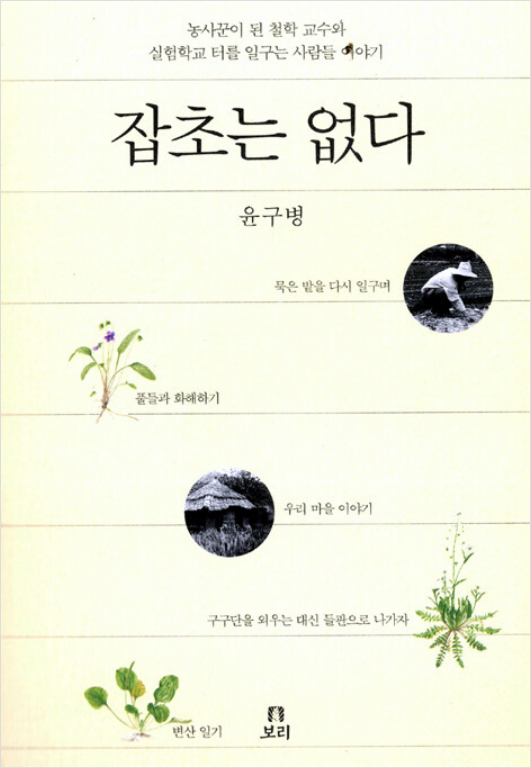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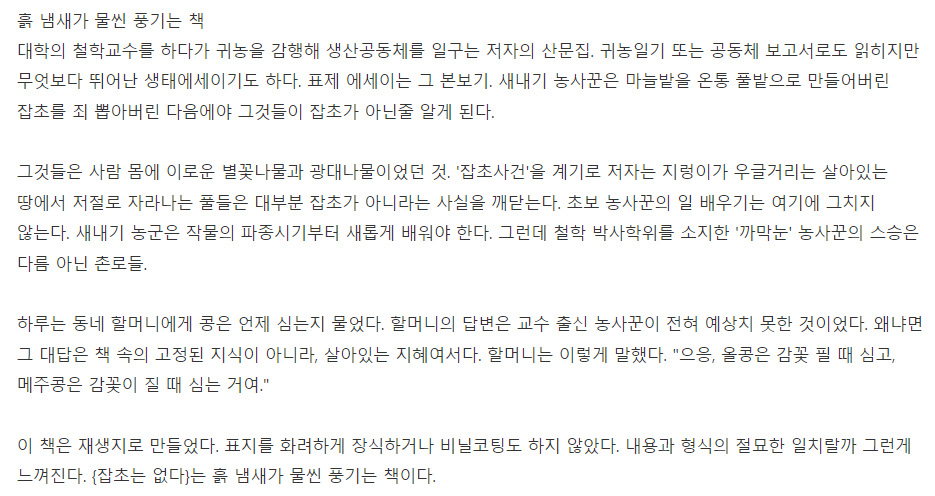
저자는 변산공동체학교를 꾸리며 대학교수를 그만두고 농사꾼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쓴 이야기가 아직도 끌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주려고 출판사도 만들었습니다. 독서교육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그건 어쩌면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듯합니다.
“한 권의 책을 읽혀도 좋으니 제대로 된 책을 읽혀야 한다. 제대로 된 책이라는 말이 잘 잡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한 권의 책을 읽히더라도 주인이 쓴 글을 읽혀야 하고 손님이나 종이 쓴 글은 읽히지 말아야 한다.” “꾸며 쓴 글은 대체로 죽은 글이고 고작해야 손님이나 종의 처지에서 쓴 글이라고 보아도 틀림없다. 글을 꾸미는 것은 남에게,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다. 한때는 글쓰는 사람들이 권력자들 밑에서 종살이를 하고, 요즈음에는 돈에 팔려 읽는 사람의 비위에 맞추며 본심을 숨기고 그럴 듯하게 꾸미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하도 교묘하게 꾸며서 꾸몄는지도 모르게 꾸미는 재주를 가진 사람도 한둘이 아니다.”
또 제목처럼 ‘잡초’에 대한 글이 여럿 보입니다. 아마도 농사꾼에게 잡초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초제로 쉽게 해결하지 않으려 고민합니다. “‘잡초’들과 날마다 땡볕 속에서 싸워야 할 상황이 빚어졌던 것은 우리가 가꾸는 농작물들이 ‘잡초’와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에 ‘잡초’라고 여겼던 것이 농사의 훼방꾼이 아니라 자연이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땅에 뿌려준 고마운 먹이라면 어떨까? 따로 가꾸지 않고 거름을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약초나 나물의 일종이라면?” 그리고 이른 봄에 겪었던 ‘잡초’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때 마늘밭을 풀밭으로 바꾸어 놓았던 그 풀들을 죄다 뽑아 썩혀버린 뒤에야 알게 된 사건입니다. 그 풀들이 ‘잡초’가 아니라 별꽃나무, 광대나물이었다느 걸 알고 후회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존을 꿈꾸기도 합니다. “정말 ‘잡초’가 두렵다면 ‘잡초’와 공존할 수 있거나 ‘잡초’를 이겨낼 농작물을 심고 가꾸면 된다. 밭에 보리와 밀을 심었더니 ‘잡초’걱정이 덜하다. 그렇다고 한 해 내내 밀 보리 농사를 지을 수는 없으니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겠지. 논에 오리나 우렁이를 풀어놓아 ‘잡초’를 먹고 자라게 하는 농사법도 유기농을 하는 분들 사이에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라고. 그는 살아있는 땅에서 저절로 자라는 풀들 대부분은 잡초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황대권 ∣ 열림원 ∣ 232쪽 ∣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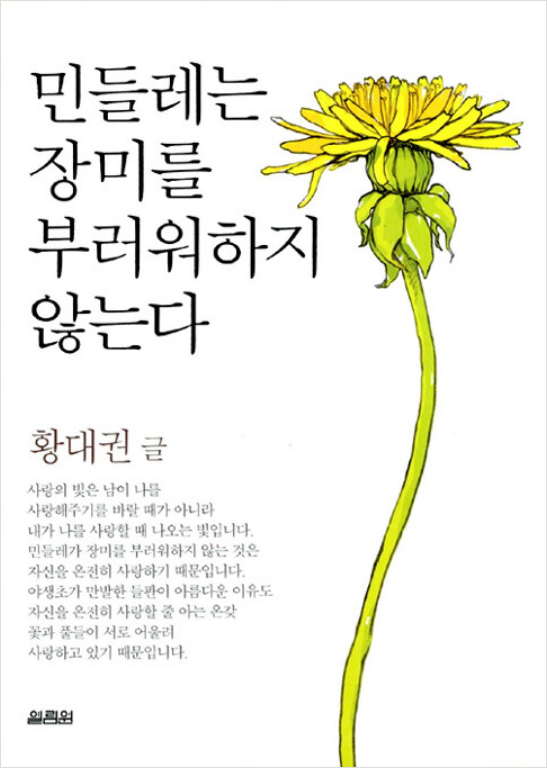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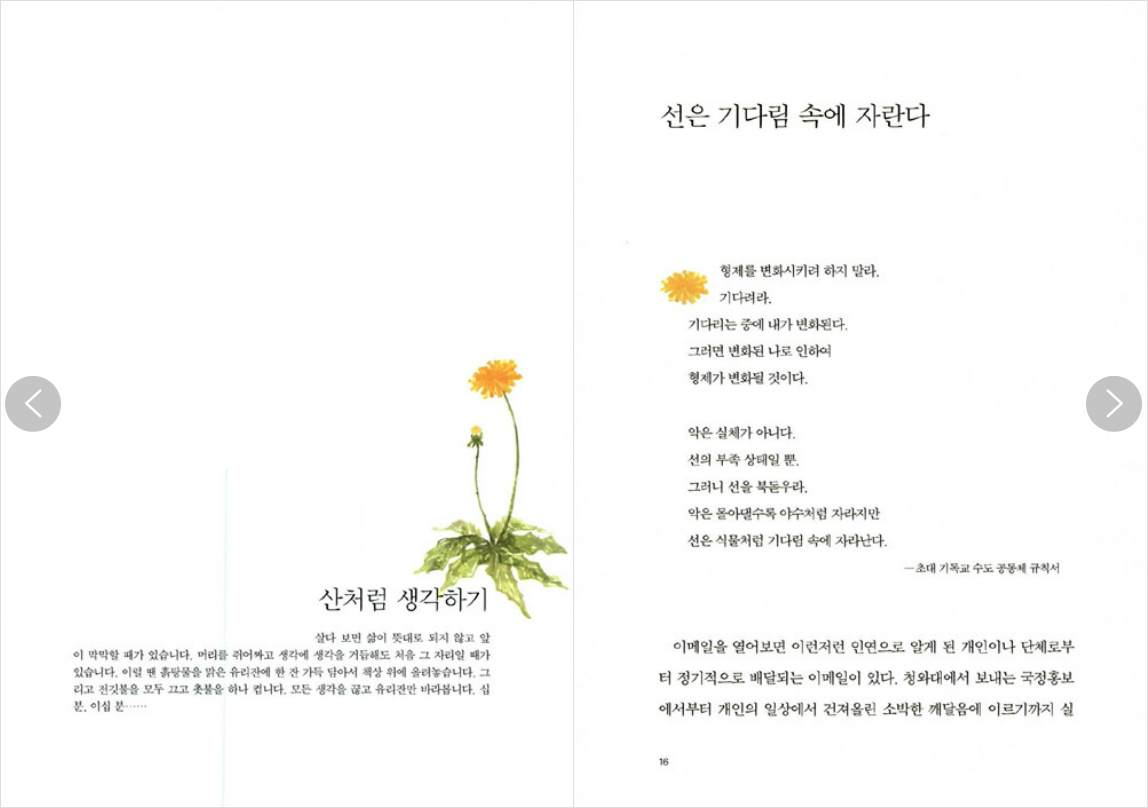
<야생초 편지>를 알려진 저자가 정치범 석방으로 세상에 나와 생태공동체 운동가의 길을 걸으며 쓴 글입니다. 속도를 내는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막연하나마 행복은 속도와 반비례할 것이란 생각이 든다. 대체로 무서운 속력을 내는 사람들은 까닭없이 주위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종국에는 자신마저도 망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살다 보면 속도를 내야 할 때가 있기는 있다. 그러나 지금 한국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높은 속도는 ‘어쩌다’가 아니라 거의 ‘올 타임(all time)’이다. 라즈니쉬의 말마따나 삶을 살 시간이 없는 지경이다.” 그리고 <직선은 곡선을 이길 수 없다>는 글에서 말합니다. “자연 속에 직선은 없다. 있다 해도 그것은 곡선의 일부이거나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에 직선이 없는 이유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다. 지구라는 행성 위에 오직 인간만이 직선을 만들어내고 직선을 좋아한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직선을 닮아버린 사람의 마음은 서로를 찌르고 밀쳐내며 오로지 키재기에만 몰두한다. 지고는 못 배기는 직선의 마음은 도시의 확대로 이어지고 확대된 도시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면서 자연의 파괴는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만다.”
죽음에 대해선 단호합니다.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한다.”고. 그게 자연의 이치라고. 물론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살려야 하지만 억지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건 동물이건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하면 그 자신도 비참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주위 환경인 생태계에 해를 끼치게 된다.”고. 그러면서 품위있게 삶을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가장 원시적인 부족 가운데 하나인 오스트레일리아 한 부족이야기로 합니다. 자신이 늙고 병들어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면 벌판에 홀로 나아가 단식으로 생을 마감한다고 말합니다. 한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 중 ‘밥상’을 말하는 부분도 와 닿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매일 마주하는 밥상이라고. “양계장 같은 환경에 앉아 화공약품으로 뒤범벅이 된 음식을 먹으면서 고귀한 영혼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어나길 기대하는 것과 같다. 고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밥상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주상태
오늘도 사진과 책, 책과 사진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간다!
60+책의해 홈페이지에 실린 글의 저작권은 글쓴이에게, 이미지의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모든 저작물은 비상업적 목적으로 다운로드, 인쇄, 복사, 공유, 수정, 변경할 수 있지만, 반드시 출처(60book.net)를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