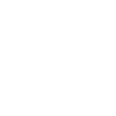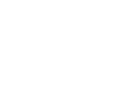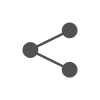본 글은 2021 60+책의해 <작가와 함께하는 행BOOK학교> 프로그램을 취재한 글입니다.
<작가와 함께하는 행BOOK학교> 생애사 쓰기 – ‘자상한시간’에서 진행)

‘자상한시간’은 그런 공간이다.
고양이가 지나간다. 길고양이는 사람들과 거리를 유지한다. 딱히 피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곁을 주지도 않는다. 관악구는 고양이들에게 친절한 동네가 많다. 주택들 사이 구석구석에는 밥그릇과 물그릇이 종종 눈에 띈다. 고양이가 정해놓은 거리를 인정하고 지켜본다. 누가 밥을 줘도 딱히 큰 소리를 내진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양이들에게 무관심하겠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바로 적절한 친절이 되기도 한다.
역설적이게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울이라는 공간은 삭막하다. 물론 삭막함에 옳고그름의 판단은 없다. 자기소개가 필요 없는 곳. 편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곳. 언제나, 우리는 외로움을 거부하면서도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한다.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모르는 척 해주는 것. 우리가 도시에서 바라는 거리는 그런 것일지 모른다. 고양이와 인간의 거리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단골 가게에서 아는 척을 하면 어색해하고, 친한 척을 하면 발길을 끊는다. 항상 친절하게 처음처럼 맞이해 줄 수 있는 곳. 그럼에도 눈빛만으로 아는 척 해주는 곳. 도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
‘자상한시간’은 그런 공간이다. 친절한 거리를 잘 알고 있는 곳. 집에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 잠시 앉았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곳. 사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귀갓길에 들려 잠시 쉴 수 있는 곳. 그야말로 자상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이다. 잠시 멈춰 서가를 바라볼지 모른다. 서가가 추천하는 책을 읽거나, 책을 읽지 않더라도 테이블에 앉아 골목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관찰할지도 모르겠다. 잠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공간을 볼 수 있는 곳. 거리를 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배려한다는 것이다. 그런 배려는 자상한 생각과 행동에서 나온다.
책을 사랑하기에 모두 책을 가까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 태어난 곳. 서점 주인의 열정으로 운영되는 공간. 도시 속 우물과도 같은 공간. 우리에게는 자상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앉아 프로젝터에 집중한다. 잠시 동안의 강의 후 각자 만들 동화책을 구상하고 질문한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림을 찾는 사람. 자신의 이야기에 어울릴 그림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강사 선생님과 진지하게 대화하다가도 서점 대표님이 지나갈 때 서점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서점을 너무 예쁘게 꾸며놨어요.”
빛이 들어오는 길을 따라 여러 개의 화분이 이어진다. 화분은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며 그 자리에 멈춰 시간을 공유한다.

나를 사랑하는 시간.
타인을 이해하는 시간.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시간.
한눈팔면 재밌는 시간.
이 공간이 추구하는 것은 시간이다. 대부분의 사유와 의미는 때와 장소에서 발생한다. 때가 시간에 집착하거나 공간이 장소에 집착할 때 의미는 발생하지 못한다.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 그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의미이지만, 때로 1+1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들도 상황에 따라, 해가 뜨는 순간처럼 깊은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잊은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고 이해받기만을 바란다. 강하게 공감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들일수록 공감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강할 사람일수록 자신이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일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거창한 시간인가. 아름다움을 꿈꾸기 위해 우리는 한눈을 판다. 그곳에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각 책장의 이름이다. 그 책장에는 서점에서 그 상황에 어울린다 생각하는 책들을 비치해 놓았다. 흔히 장르별로 찾기 쉽게 만들어놓은 서가가 아니다. 서점이 사람들에게 은근히 전해주고 싶은 의도에 따라 우리는 책장 앞에 선다. 하지만 결코 강요하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 이것을 읽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조심스럽게 권하는 시간. 당신을 위한 시간이다.

당신이 집에 돌아가는 골목에 자상한 시간이 있다면 좋겠다.
도시에서 책방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할까. 서점이 위치한 장소가 서점의 방향을 정하는 것일까. 서점 주인의 철학이 그 장소를 고르는 것일까. 서점의 방향은 과연 서점 대표의 이상에 가까워질 수 있는가.
자상한시간 뿐 아니라. 요즘 시대에 서점을 한다는 것은 주인의 열정과 애정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장사지만 이득을 위해서만 한다 볼 수 없고, 그렇다고 자선사업을 하는 곳도 아니다. 사명감으로 운영할 수는 없지만, 사명감만으로 할 수는 없는 곳. 어쩌면 근본적으로 모순 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일. 그것이 동네책방의 현실일 것이다.
마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물건을 파는 기분일까. 당신이 집에 돌아가는 골목에 자상한 시간이 있다면 좋겠다. 그곳에서 당신은 공감받기보다 공감하는 사람이 된다면 더 좋겠다. 그것은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니. 당신이 그런 여유를 가지고 집으로 귀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나 자상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내일을 위해. 아니 오늘 밤을 위해.

이태형
소설가. 탄광촌에서 태어났다. 대학 시절 매직리얼리즘을 접하고 유년 시절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현실의 삶은 언제나 환상보다 놀랍고 잔인하다.
지은 책으로 불신에 대한 내용을 그린 『그랑기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