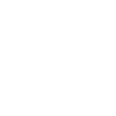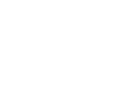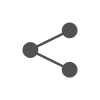본 글은 2021 60+책의해 <작가와 함께하는 행BOOK학교> 프로그램을 취재한 글입니다.
<작가와 함께하는 행BOOK학교> 생애사 쓰기 – 북살롱부산에서 진행)
살롱[프랑스어]salon: 명사
1. 서양풍의 객실이나 응접실.
2. 상류 가정의 객실에서 열리는 사교적인 집회. 특히 프랑스에서 유행하였다.
3. 미술 단체의 정기 전람회.
4. 양장점, 미장원, 양화점 또는 양주 따위를 파는 술집의 옥호(屋號)를 속되게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사전적 의미로만 한정하기에 살롱은 너무나 넓고 큰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에서 연배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철학이라는 단어에서 철학관을 떠올린다. 철학이라는 단어가 사주팔자를 칭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철학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 또한 틀린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학이 많은 의미를 포옹할 수 있을 뿐, 사주가 철학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살롱 역시 비슷하다. 아마 보통의 사람들은 살롱에서 헤어샵을 떠올릴 것이다.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여 공간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유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헤어샵과 서점은 크게 차이가 없을지도 모른다.
과연 그럴까.
대학 시절 학교 앞에 있던 마지막 인문사회서적이 문을 닫은 자리에 네일샵이 문을 열었다. 이후 그 골목을 피해 다녔다. 점심값을 아껴 시집을 사던 곳. 어느 수업에서, 어떤 선배가, 또 누군가가. 말한 책을 찾아 세상의 모든 책을 읽을 것 같이 호기롭게 문을 열어 들어가던 곳. 그처럼 단순히 책을 팔거나 읽는 것 보다 서로 간의 연결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들이 있다.

‘사람이 책이 되고 다시 사람과의 끈이 되는 북살롱_부산입니다’
대부분의 작은서점들은 주택가, 즉 삶이 위치한 곳에 있다. 동래구는 부산사람이 아니라면 낯선 장소다. 부산에 놀러 왔을 때 동래구를 방문할 이유는 떠오르지 않는다.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제가 열리는 것도 아니다. 서점을 방문한 시기는 한참 영화제가 진행되는 기간이었는데. 그런 축제 분위기도 전혀 없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작은 서점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삶 사이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서점에 들어서자 큰 소리가 오가고 있었다. 순간 누가 싸우고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혼내고 있는 건가, 라는 걱정이 들었다. 문을 여는 것을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화난 표정의 사람은 없었고, 모두 진지한 얼굴로 글을 쓴다는 것의 의미와 방식에 집중하고 있었다. 속으로 조금 웃으며 생각했다.
부산에 왔구나.
경상도는 아니지만 나 역시 대학에 처음 갔을 때 동기들에게 왜 자꾸 화를 내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그때 생각이 나며 억양은 모르는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지, 라고 생각했다.

‘커피와 맥주가 있는 동네 책방’
이 서점에는 맥주가 있다. 살롱을 표방하니 당연한 일인가! 맥주를 파는 카페도 만나기 힘든 요즘, 맥주를 파는 서점이라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른다. 10월이지만 걸어오는 동안 더웠기에 시원한 맥주를 한잔하고픈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그 반가움과 유혹은 언제인가로 미루기로 한다.
서점 내부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팔기 위한 책들이 있는 서가가 반으로 나뉘어 있다. 파티션이 아닌 분위기가 나누고 있는 공간은 신기하다. 완전히 막힌 공간도 아니고 트인 공간도 아닌, 오히려 정서적인 믿음이 안정감을 줄 때도 있다. 서점의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고른다. 글쓰기 수업의 참여자들은 신경 쓰지 않고 의견을 나눈다. 지극히 공적인 공간임과 동시에 사적인 공간이다. 그 모습을 보고 서점의 손님들도 이 공간이 표방하는 살롱이란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분명하다.
자신 주위의 삶과 그에 대한 깊은 사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들.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한 이유와 그 방식을 찾기에 살롱처럼 완벽한 형태의 장소는 없을 것이다.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선 안 된다. 생활글쓰기란 단지 내 일상을 기록하는 것만도 아니다. 글쓰기란 두 가지 방향으로 다가오고 동시에 멀어진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와 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글쓰기를 배워 그 끝에 도달하는 형식이 무엇일지는 모른다. 누군가는 소설을 쓸 것이고 누군가는 깊이 있는 산문을 완성할 것이다. 어쩌면 시를 쓰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그림 또는 사진에 간단한 글귀를 적을지도.

서가에는 과연 요즘 시대에 팔릴까 싶은 책들이 보인다.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문맹>, 페터 한트케의 산문들, <아서 매켄 단편선>. 서가가 작은 작은 서점 특성상 쉬 보기 힘든 책들이다. 우리는 어느덧 너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좋은 책들이라 생각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책보다, 서점이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파는 공간이다. 아서 매켄의 책을 뽑아 카운터로 향한다.
창밖으로 온천천이 흐르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창을 통해 햇볕이 쏟아져 들어온다. 아주 따뜻하다. 조금만 졸고 싶어졌다. 책을 들고, 조금만.

이태형
소설가. 탄광촌에서 태어났다. 대학 시절 매직리얼리즘을 접하고 유년 시절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현실의 삶은 언제나 환상보다 놀랍고 잔인하다.
지은 책으로 불신에 대한 내용을 그린 『그랑기뇰』이 있다.